산업
총수 지분율 높은 기업, 독단 경영 견제장치 어떻게 하나
부영은 국내 20대 그룹 중 사외이사가 없는 유일한 집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 순위에서 부영은 20.65%로 게임사인 크래프톤 39.82%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는 부영의 총수지분율이 단연 1위다. 공정위 발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20%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7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0.4%로 2021년에 비해 2.3% 증가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66개의 내부 지분율도 59.9%로 1.9% 상승했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은 53.3%로 2021년 대비 1.6% 올랐다. 공정위는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총수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총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투명 경영을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거나 사외이사제를 활용하고 있다.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영의 경우는 사외이사가 전무하다. 국내 상위 20대 그룹 중 사외이사가 없는 건 부영이 유일하다. 재계 1~3위 삼성과 SK, 현대차의 경우 각 58명, 69명, 72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재계 18위 DL의 경우도 사외이사 10명을 두고 있고, 20위 증흥건설도 4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부영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비상장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에 다른 대기업들에는 의무적으로 있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도 두지 않고 있다.
식품기업인 풀무원의 경우 창업자 남승우가 51.56%라는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이 아닌 중견기업의 모범 지배구조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8년 남승우 창업자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ESG(경영·사회·지배구조) 대상을 수상했고, 11명의 이사회에서 8명을 사외이사로 채우는 등 경영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비상장사는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 독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 경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사외이사제가 대표적”이라며 “기업은 직원과 고객이 만족도를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03 06:59












![[PC&MOBILE-리뉴얼] 행사&비즈니스7 (300x80)](https://image.isplus.com/data/isp/upload/save/popup/isp16956935979933.600.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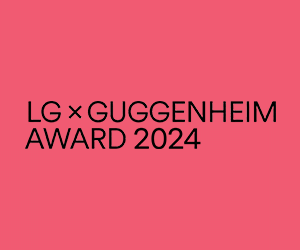

![[포토] 이숭용감독 ,가벼운 발걸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32.400x280.0.jpg)
![[포토] 이로운 ,세이브를 축하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31.400x280.0.jpg)
![[포토] SSG ,삼성에 2연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30.400x280.0.jpg)
![[포토] SSG ,삼성에 위닝시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29.400x280.0.jpg)
![[포토] SSG ,삼성에 4-0 승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28.400x280.0.jpg)
![[포토] 이로운-김민식 ,이겼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25.400x280.0.jpg)
![[포토] 이로운 ,이겼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22.400x280.0.jpg)
![[포토] 역투하는 이로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19.400x280.0.jpg)
![[포토] 경기지켜보는 박병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18.400x280.0.jpg)
![[포토] 박병호 8회 안타, 영패는 없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06.400x280.0.jpg)
![[포토] 박병호,8회 추격의 안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05.400x280.0.jpg)
![[포토] 박병호, 8회 선두타자 안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6/isp20240606000303.400x280.0.jpg)
